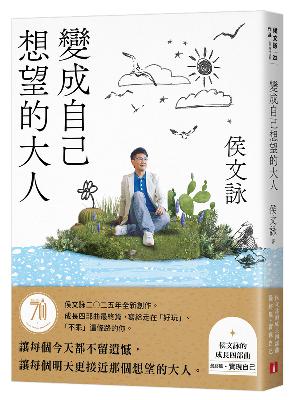몸은 미국에, 마음은 타이완에…《타이완인의 순정—타이완계 미국인》 ✨
Description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번이라도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문학입니다. <포르모사 문학관>에서 타이완 특유의 문학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모사 문학관> 시즌2의 진행자 안우산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黃仁勳) CEO, AMD의 리사 수(蘇姿丰) CEO, 유튜브의 공동설립자 스티브 천(陳士駿), 야후의 공동설립자 제리 양(楊致遠), 그리고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리안(李安) 감독. 모두 귀에 익은 이름들이죠. 각자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룬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완계 미국인이라는 사실!
타이완계 미국인 - 사진: 위키백과 캡처
미국 정부가 2020년 실시한 인구 조사에 따르면, 타이완계 미국인은 약 33만 3천 명으로, 2010년보다 10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조사 항목에는 ‘Taiwanese’ 옵션이 없고 ‘Chinese’만 존재해, ‘기타’에 따로 표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구는 조사 결과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죠.
베테랑 언론인 루스샹(盧世祥)이 최근 발표한 신작 《타이완인의 순정—타이완계 미국인(純情的台灣人—台美人)》, 수십만 명 타이완계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했던 루스샹은 지난 24일 신작 발표회에서 “미국에서 타이완을 위해 애쓴 이들은 타이완인의 순정을 보여줬다”며, “이 순정은 순진함이 아니라, 진심과 깊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타이완계 미국인의 성취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타이완 민주화 이전에는 많은 이들이 중화민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타이완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피, 땀, 눈물이 모두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타이완계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학을 통한 미국 이민 🧑🎓
타이완계 미국인(Taiwanese American), 줄여서 ‘대미인(臺美人)’, 조상이나 부모, 또는 본인이 타이완 출신인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거주자를 가리킵니다. 타이완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많은 타이완계 미국인들은 중화민국과 미국, 두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이들은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를 이어왔고, 또 복잡한 정체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타이완 민주화 이후에는 ‘중국계 미국인’이 아닌 ‘타이완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완인의 미국 이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세기 초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이미 그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타이완 학생들이 유학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이 중 첫 주인공은 뉴욕대학교 경영학에 입학한 리옌시(李延禧, Ri Enki)입니다. 그는 학업을 마친 1911년 타이완으로 돌아와 금융업에 뛰어들었으며, 타이완 금융업의 선구자로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미국 유학길에 오른 최초의 타이완인 리옌시(李延禧, Ri Enki) - 사진: 위키백과
1941년 ‘타이완 구미 동창회 명부’에 따르면, 타이완의 미국 유학생 수는 31명으로, 당시 타이완의 구미 유학 대상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발발한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이 미국을 적대하게 되면서 타이완인 유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일부 타이완인 유학생들은 오히려 미국 정부의 징집에 응해 미군에 합류했다는 사실인데요. 일본과 미국 사이에 놓여 있던 타이완인들의 정체성은 그만큼 복잡했습니다.
'타이완계 미국인'의 탄생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공과의 대립 속에서 중화민국 정부는 타이완인의 해외 이주를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여권 신청조차 어려웠었죠. 미국으로 갈 수 있었던 타이완인은 대부분 국민당 정부와 가까운 외성인들이었고, 중국에서 타이완으로 건너온 후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그 시절 미국은 중화민국을 ‘유일한 중국’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이민 쿼터는 전부 타이완으로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당시 미국에 정착한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계염령과 백색테러가 휩쓸던 시절, 중화민국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이민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학이라는 길을 통해 정부의 제한을 피해 미국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특히 타이완독립을 외친 이민자들은 ‘타이완계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은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블랙리스트에 올라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타이완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타이완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큰 울림을 준 노래, 원샤(文夏)의 ‘황혼의 고향(黃昏的故鄉)’을 함께 들어보시죠. 일본 가요를 원곡으로 한 이 노래는 고향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담고 있어, 타이완독립 운동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민주화 이전에는 금지곡이었습니다.
시니어 교포와 주니어 교포 🧳
1970년대에 들어 타이완은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외교적으로는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1971년 유엔 탈퇴에 이어 1979년에는 미국과 단교했죠. 이런 배경 아래 타이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 물결이 일어났는데요. 게다가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원래 타이완에 주어지던 이민 쿼터는 거의 모두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1982년, 타이완계 미국인의 청원을 통해서야 비로소 타이완이 하나의 개채로 이민 인원수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타이완은 전자산업을 키우기 위해 수많은 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그 결과 1983년부터 1989년까지, 타이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이민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경제와 정치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서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와 유학생 수는 1990년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타이완을 중국과 구별해 인식하는 ‘본토의식’이 대두되었고, ‘타이완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공식적으로 ‘중국계 미국인’을 대신했습니다. 또 민주화를 경계로, 이전 세대 이민자는 ‘노교(老僑, 시니어 교포)’, 이후 세대 이민자는 ‘신교(주니어 교포)’라고 불리며 이민사의 흐름을 확립했습니다. 이 파란만장한 역사는 바로 루스샹의 《타이완인의 순정》에 담겨 있습니다.
전화 응답기로 만든 라디오 📻️
1980년대, 루스샹 역시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타이완의 외교 슬럼프를 몸소 겪었는데요. 타이완 정부의 엄격한 감시 속에서 미국 내에서 타이완 소식을 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학생들은 전화 응답기를 이용해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고 온라인 공동체를 결성했습니다. 루스샹은 전화를 걸면 약 3분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 타이완계 미국인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를 리스크를 감수하며 타이완의 민주주의와 외교를 위해 힘썼고, 심지어 미국 의회에 직접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계 미국인에게 블랙리스트는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1949년 계염령이 선포된 후에는, 타이완독립 주장부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상, 좌파 발언까지 모두 금지 사항이었죠. 이러한 입장을 보인 사람들은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1992년 형법 개정 이후에야 사라졌습니다. 리스트에 오른 많은 타이완계 미국인은 20~30년 동안 타이완에 돌아오지 못했고, 심지어 가족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늘 메이리다오에 있다 🫶🏼
《타이완인의 순정》의 부제목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늘 메이리다오(타이완)에 있다(人在美利堅,心在美麗島)” 낯선 타국에서 타이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 있었기에, 타이완은 가장 힘겨운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지나, 이제 타이완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잡고 있죠. 국내외 인사들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는 더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포르모사 문학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우산이었습니다.
▲참고자료:
1. 邱祖胤,「盧世祥寫『純情的台灣人』 看見真誠深情台美人」,中央社。
2. 臺灣之音,國家人權記憶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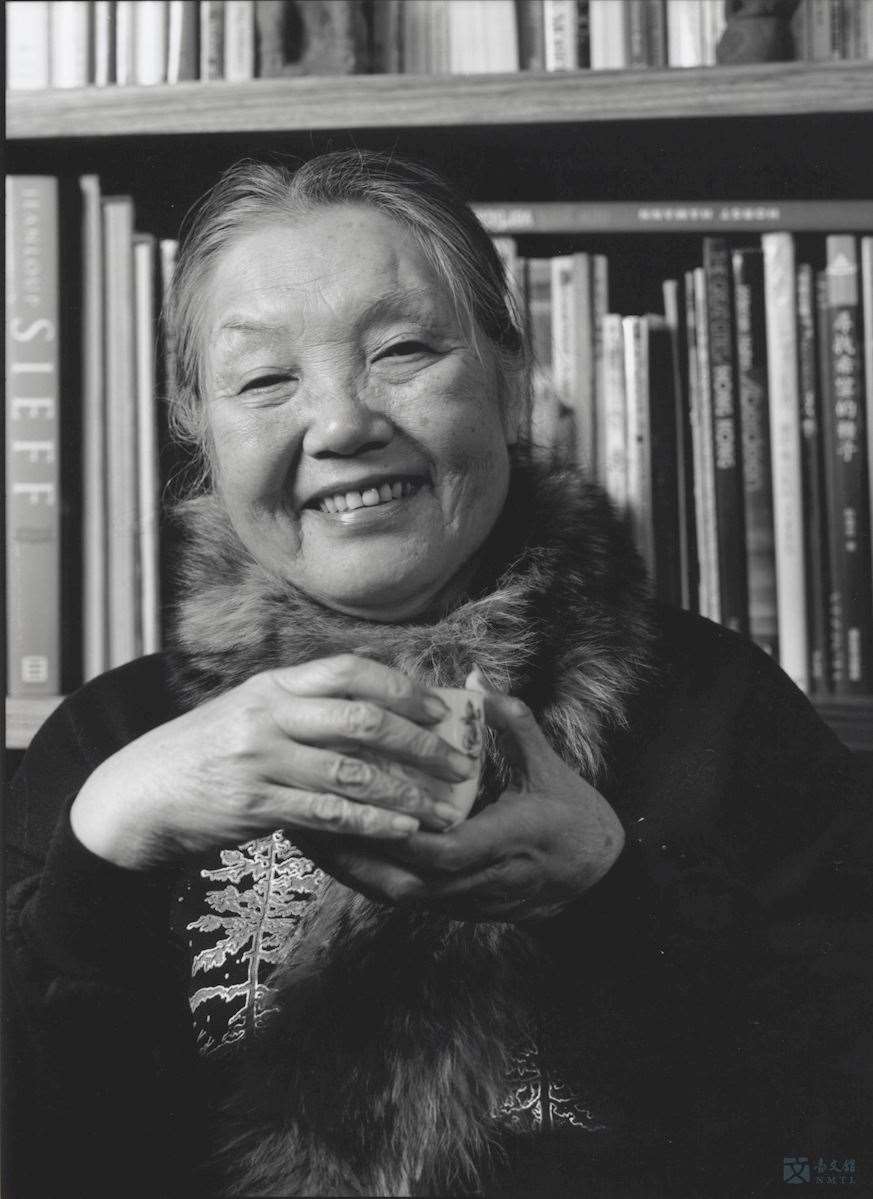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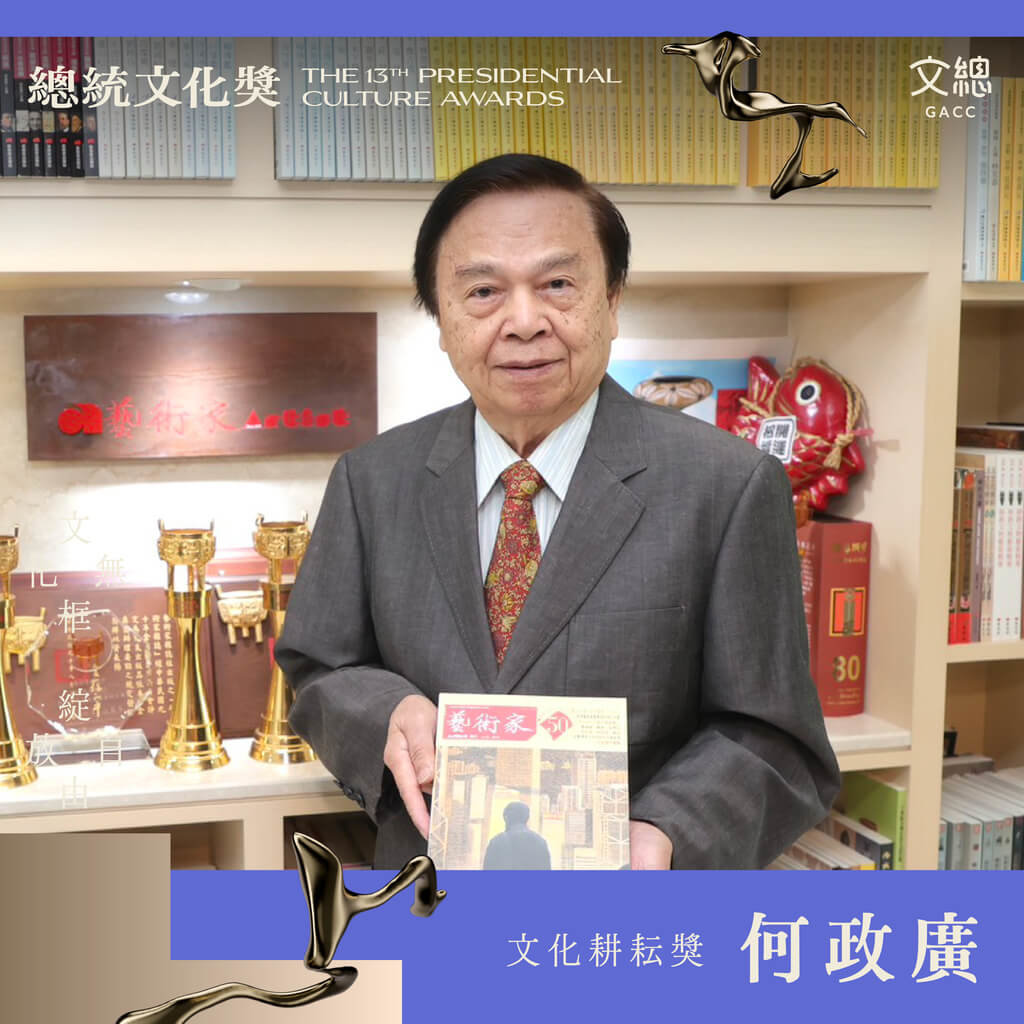

![[아버지날] 타이완 문단의 상록수, 100세 작가 왕딩쥔(王鼎鈞) 💯 [아버지날] 타이완 문단의 상록수, 100세 작가 왕딩쥔(王鼎鈞) 💯](https://d1qd3zoyy91a2c.cloudfront.net/image/krrti/images/listimg/2025/7/original/8196ab46-cbde-4d4f-b309-ed23fccdf29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