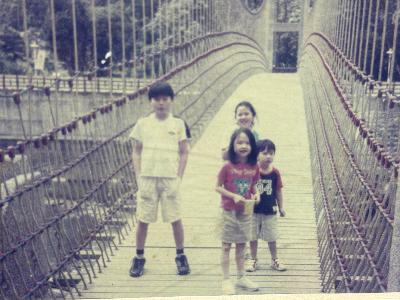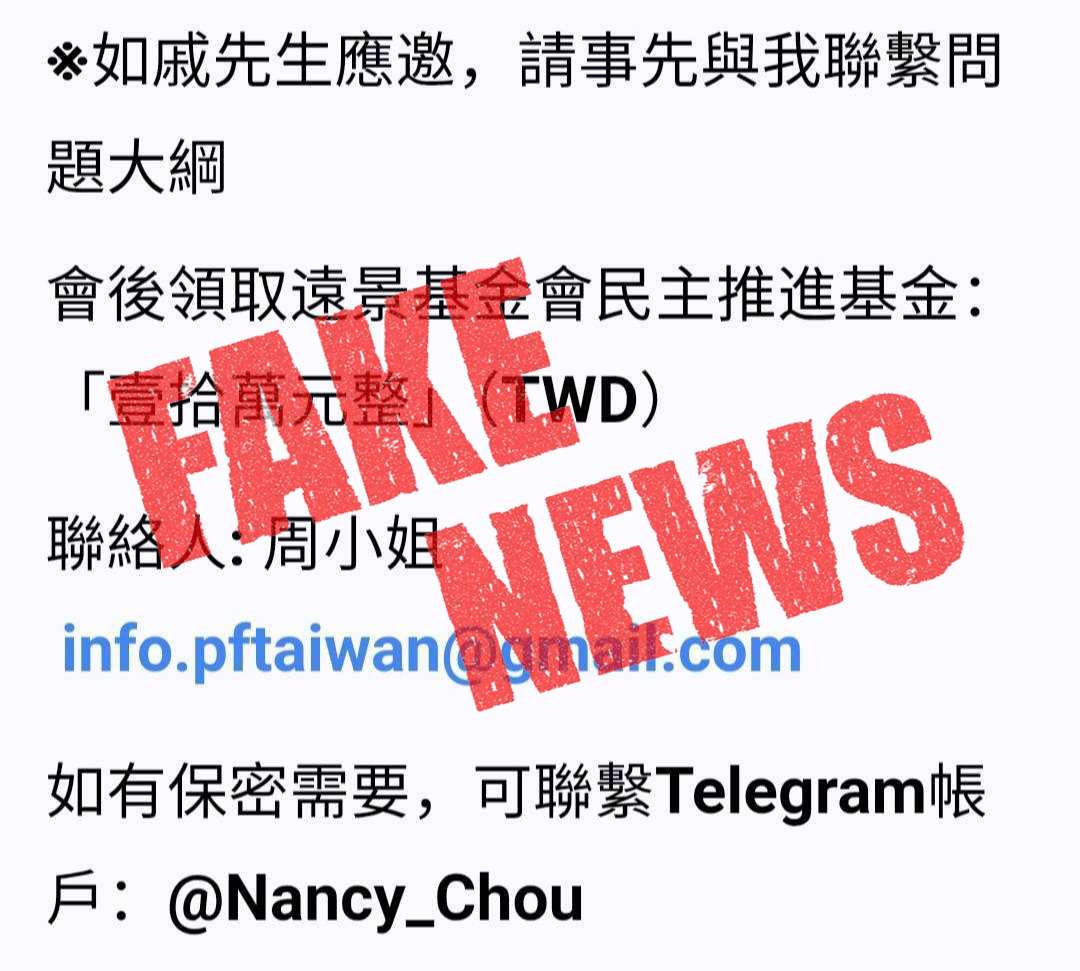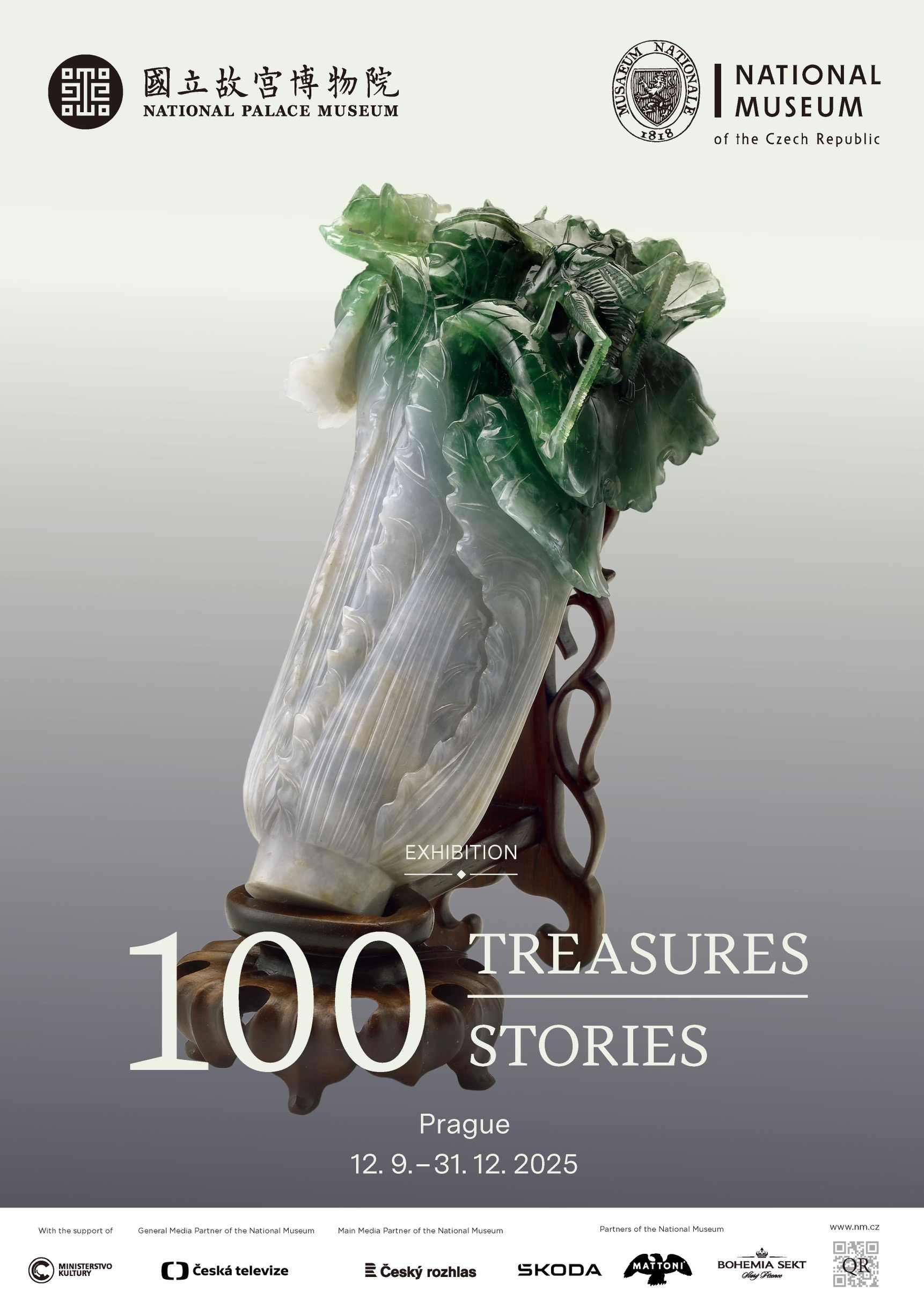출산율 저하, 사회ㆍ경제ㆍ국방… 모두 문제
Description
출산율 저하, 사회ㆍ경제ㆍ국방… 모두 문제
-2025.08.11.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오프닝)
국가안전 위기에 적용되는 ‘위기’는 천재지변, 내란, 외환, 전쟁 등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21세기 들어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건 인구 구조 문제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모두 60대를 넘어섰고, 가임 인구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면서 낮은 출생률은 곧 국가 안전 위기로 보게 된다.
인구 수를 본다면, 중화민국 타이완지역의 2024년 인구 수는 2,342만442명으로 추정하였는데, 지난 금요일(8월8일) 내정부가 공포한 최신 호구(戶口)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타이완의 총 인구 수는 2,333만7,936명이다. 작년말 총인구수의 추정 수와 비교하여 82,506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 신생아는 각 지방별로
신베이시 610
타이베이시 1055
타오위안시 1030
타이중시 800
가오슝시 880
이란현 845
신주현 945
먀오리현 710
장화현 1105
난터우현 835
윈린현 1055
쟈이현 775
핑둥현 890
타이둥현 1215
화리엔현 920
펑후현1070
지룽시 610
신주시1015
쟈이시 660
진먼현 685
리엔쟝현 1140
합계출산율(TFR)은 0.89명으로 집계되었다.
최신 통계는 내정부가 발표한 올해 7월말까지의 총인구수 2,333만7,936명으로, 6월달 대비 무려 8,805명이 감소하였고, 7월달의 신생아 수는 8,939명으로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신생아의 비율)은 천분의 4.51, 작년 동기 대비 1,485명이 줄었고, 전월 대비 29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만약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신생아 64,314명과 작년 동기(2024년1월~7월, 신생아 74,298명)와 비교할 경우 무려 9,984명이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인구의 자연증가율, 즉 출생인구에서 사망자 수를 뺀 숫자로 계산하면 타이완의 7월분 인구 자연증가율은 마이너스 7,907명이다.
타이완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의 4.0명에서 2024년 기준으로는 0.87명에 불과하다. 시간을 좀더 거슬러 올라가 1951년도의 타이완 합계출산율을 보면 7.04명에 달했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총인구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7%에 달할 경우 ‘고령화사회’라고 정의하고 있고, 만약 14%에 달할 경우 ‘고령사회’, 20%에 달하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타이완은 올해 ‘초고령사회’로 매진하면서 7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458만3,678명으로 총 인구의 19.6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신생아에서부터 14세 사이의 영유아ㆍ소년 인구는 전체에 11.62%에 불과하며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는 전체의 68.74%로 나타났다.
출생률 저하는 국가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며, 인구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은 미래 노동력 부족과 사회 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국방 인력을 충족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뒤따르므로 총체적인 국가 경제와 국방 안전의 위기를 의미하기도 하다.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들을 꼽으라면 단연코 타이완과 한국이 앞순위에 있다. 타이완의 현황은 합계출산율 0.87명으로 이미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2022년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 5,167만2,569명,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1970년의 4.53명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타이완도 마찬가지 수준이다.
타이완과 한국의 출생률이 1명 이하로 떨어져 출산 장려 등의 여러 정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출생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 일본은 어떠할까? 2023년 기준 일본의 출생률은 그나마 1명을 넘어섰다. 1.2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는 일본이 2차 대전 이후(1947년) 인구 출생 통계를 작성한 지 77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2024년 기준 타이완 0.87명, 한국 0.75명, 일본은 2023년 기준 1.2명이다. 타이완과 한국은 1970년도를 인구 출생률 시작점으로 하는 통계 숫자를 볼 수 있는데, 그때만 했어도 각각 4명과 4.53명이었다. 지금 왜 10대에서 50세 사이의 각 연령별 출산율(ASFR)을 다 합산해도 출생률이 낮을까?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개념처럼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사라졌고, 지금은 비혼주의에 결혼을 해도 늦결혼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출산 적령기를 놓쳐서도 그렇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1970년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서 가정이나 사회의 기대가 아닌 스스로 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도 ‘자녀는 필수가 아니다’라는 분위기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나 경제적으로 소극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이든 지자체이든 출산 장려에 애쓰고 있는데 타이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중에서 ‘경제’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천정부지의 부동산 가격도 한몫을 하고 있다.
대체출산율은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 2.1명 수준을 말한다. 이게 바로 ‘안정인구’인데, 아무리 봐도 타이완이 지금의 1인 이하에서 2인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담을 그 누구도 못할 것이다.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세계 36개 주요 국가와 지역의 2025년 인구 예측에서 18세 이하 인구 비례가 가장 낮은 곳은 홍콩으로 홍콩 전체 인구의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18세 이하 인구의 점유율이 가장 낮은 5개 국가 모두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홍콩(전체 인구의 12.6%), 한국(전체 인구의 12.9%), 타이완과 일본은 각각 전체 인구의 14%)이며, 싱가포르는 약 14.4%이다.
유럽은 아시아보다 더 일찍 저출산율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인구 증가율 통계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늘 저출산율에서 앞순위를 차지하는 원인은 유럽 국가들의 이민정책 때문이다. 비록 이민정책으로 인해 파생한 사회ㆍ경제ㆍ안전 등의 문제가 따르기는 하나 적어도 인구 구조의 노화 속도를 둔화시켜 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인구 감소 뉴스와 더불어 군 병력 부족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것을 보았다. 거의 모든 한국 언론에 실린 소식인데, 8월10일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군 병력은 7월 기준 45만명으로, 2019년 대비 무려 11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남북한의 현역 군인은 북한이 한국보다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완의 병역제도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변경했다가 다시 또 1년 군복무로 회복된 건 작년(2024) 1월이다. 당시 징집 대상자 수는 10만 명도 채우지 못한 97,828명에 불과했고, 6년 후(2031년)에 이르러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는 병역 의무 남성은 7만5천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타이완해협 양안 간의 군사력 차이는 매우 크다. 무기를 제외하고 그저 현역 군인 수만을 보더라도 중공은 2백만 명에 이르고 타이완은 25만 명이 안 된다. 양안 병력은 26.67배 정도 차이가 나, 이미 병력이 부족한 상황 아래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니 사회, 경제, 국방 모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율이 국가안전과 경제, 사회에 타격을 가한다는 걸 알고 있기에 출산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정책과 장려 조치를 내세우고는 있으나 별 효과가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 정부 관계당국에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조치들, 원론적인 말에 불과한 정책만을 제시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줬는지를 검토. 숙고하고 슬기로운 대책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